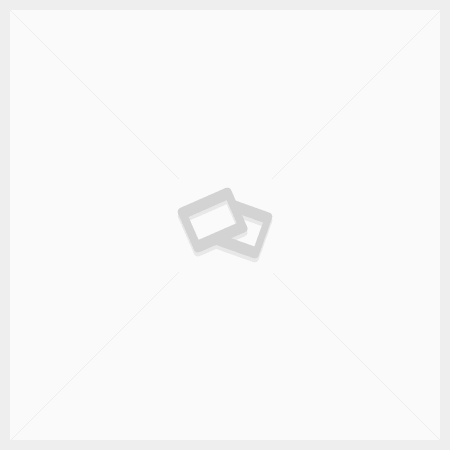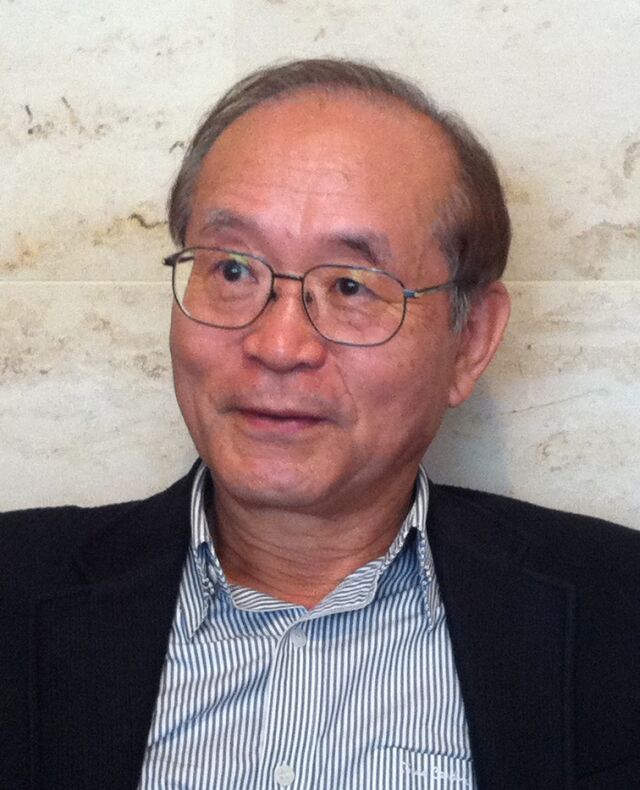[윌셔 플레이스] ‘웰 다잉’과 느림의 의학[LA중앙일보] 박용필/논설고문 기사입력: 11.15.10 21:41
오래 알고 지낸 지인 한 분이 엊그제 유명을 달리했다. 10년 넘게 지병인 당뇨와 맞서느라 몸은 많이 허물어졌으나 삶의 끝자락은 아름다웠다.
더 이상 신장투석을 할 수 없게 되자 의료진은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말자며 신체 일부의 절단을 권했다. 하지만 그 분은 기계에 의한 생명연장은 의미가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가족 및 친지들과 마지막 만남의 시간을 갖겠다며 몰핀 주사 대신 타일레놀을 으깨어 넘겼다. 그렇게 통증을 참아내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허물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했다. 가족들에겐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남긴 채 홀연히 이승을 떠났다. 삶을 포기한 게 아니라 품위있는 죽음을 맞이하려 ‘그 순간’을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한 것이다.
평범했지만 남달리 정이 많았던 그 분을 추모하기 위해 유가족은 조의금을 모두 소망소사이어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죽음을 통해 요즘 왜 미국사회에서 ‘슬로 메디신(slow medicine)’이 확산되고 있는지를 새삼 실감하게 됐다. 이른바 ‘느림의 의학’이란 것이다. 몇 날 몇 달을 더 살아보겠다며 극단적인 치료를 받는 대신 자연상태에서 천천히 눈을 감겠다는 운동이다.
‘슬로 메디신’ 창시자는 다트머스 의과대학의 데니스 매컬러 교수다. 2년 전 ‘내 어머니, 당신 어머니(My Mother, Your Mother)’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슬로 메디신’이 주목을 받게 됐다. 매컬러 교수가 존엄사를 택한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감명을 받아 써낸 책이다.
‘슬로 메디신’을 모토로 살아가는 곳이 뉴햄프셔주 하노버에 있는 켄덜 실버타운이다. 입주자 400여 명의 평균연령은 84세. 이곳 노인들 가운데 심부전증과 같은 위급상황시 심폐소생술(CPR)을 받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 뿐이다. 산소호흡기로 숨을 몰아쉬며 영양공급장치 등을 주렁주렁 매단 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아닌 비참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기 싫다는 것이다.
통계를 봐도 CPR을 받은 80~90대 노인들 중 한 달 이상 생존한 경우는 2%도 안 된다. 살아남더라도 기계에 의해 목숨을 이어간다. 이처럼 비인간적인 삶 대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자는 것이 ‘슬로 메디신’의 취지다.
켄덜엔 아기가 젖을 떼듯 느리게 약을 줄여 편안한 죽음을 맞이한 노인들이 적지 않다. 조직검사와 마취, 방사선과 항암치료 등 고통스럽고 아무 가망없는 생명 연장을 거부, 끝까지 자기 호흡을 유지하며 삶을 마감했다.
이곳에서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본 어느 딸은 “아빠는 인간의 존엄을 원했고, 원했던 것을 가졌다”고 말했다. 말기암 판정을 받은 후 곧바로 퇴원해 가족과 함께 보내며 인생을 정리한 몇 달이 지금까지 살아온 80여 년 보다 훨씬 소중했다는 말을 남긴 노인도 있었다.
누구에게나 죽음의 얼굴은 스치기만 해도 두려운 게 사실이다. 목숨에 매달려 아등바등 않고 품위를 지키며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어쩌면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승자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살겠다고 날마다 병원에 가고 하는 거, 내 생명을 저울질하며 사는 것 같아 싫어.” 몇해 전 타계한 소설가 박경리 선생이 생전에 남겼다는 말이다.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아름다운 마지막은 한 번쯤 고심해볼 만한 주제어가 아닌가 싶다. 잘 사는 것(웰빙) 못지 않게 어떻게 죽음(웰 다잉)을 맞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