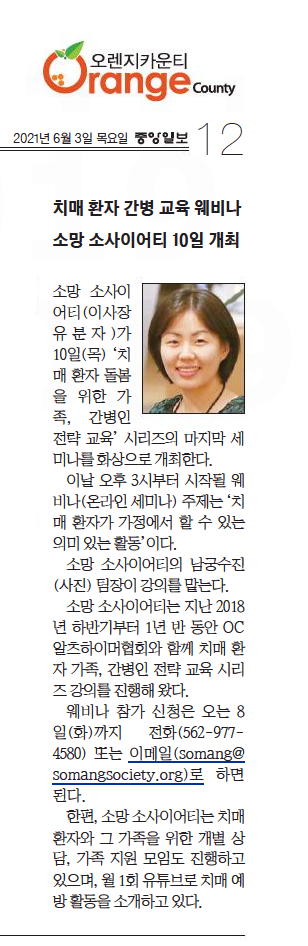“아저씨 또 올게.”
“언제 또 오느냐”는 아이의 질문만큼 내 답도 기약없었다. 수줍어서 내 손가락 하나 겨우 붙잡고 묻던 다섯살 하우아(사진)는 이내 울먹였다.
그후 3년이 지났지만, 난 아직도 그 헤어짐을 잊지 못한다. 하우아는 아프리카 극빈국 차드의 작은 마을 ‘까찌’에서 만났다.
마을 어귀에서 하우아는 울고 있었다. 배를 채우려 마신 물 때문에 아이는 배가 아팠다. 썩은 물 속 세균은 눈에도 붙었다. 아파서 울면 눈이 쓰라렸고, 눈을 비비면 다른 고통에 더 울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과 진물, 피는 구별이 없었다. 하우아의 ‘피눈물’을 3년 전 차드 특집 첫 번째 기사로 썼다. 우물을 파주기 위한 구제 프로젝트 취재였다.
결핍에도 완성이 있다면, 내게 하우아는 그런 존재였다. 하루 한끼도 먹지 못하고, 갈증이 나도 마실 물이 없고, 알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고, 매일 아파서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진품과 짝퉁’으로 나뉘던 내 살찐 가난의 기준은 하우아 때문에 거기서 무너졌다.
대부분 차드 가정의 아이들은 물 당번이다. 엄마가 수수를 줍거나, 아빠가 흙벽돌을 구워 밥벌이를 할 동안 물을 찾아 걷고 또 걷는다. 걷다가 말라리아에 걸리고, 걷다가 차에 치이고, 걷다가 물웅덩이 빠져 죽는다.
아이들의 결핍을 보면서 부모들은 자책에 아파한다. 차드 호수의 보건소 소장이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한 자리였다. 호수를 돌아보는데 배를 내준 어부 프랑스와씨와 그의 세 살 난 아들도 함께 갔다.
밥이 차려졌건만, 그의 아들은 식탁 아래서 침을 꼴깍거리며 아빠 눈치만 봤다. 손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함께 숟가락을 뜰 수 없는 예절 때문이다. 아들을 엄하게 키워야 했던 가난한 아비의 마음이 애처로웠다. 내 밥을 아이에게 줬다. 프랑스와는 “아들에게 석 달 만에 처음 먹인 쌀밥”이라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다.
그 이야기들을 나는 전했다. 기억나는 눈망울들은 맑기만 해서, 글 쓰는 내내 우울했다.
다행히 독자들은 그 이야기들을 들어줬고, 흔쾌히 도와줬다. 당초 우물 40개만 놓아줘도 성공이라고 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곳에 200개의 우물이 생겼다.
후원자들 때문에 우울함이 가셨냐고 묻는다면 그렇지도 않다. 돕는 당위성들도 절박했다. 죽은 여섯 살 아들의 이름으로 우물을 선물한 엄마의 사연이 그렇다.
중증자폐아에 발달장애까지 앓았던 티모시는 뇌사판정을 받고 1주일 만에 산소호흡기를 뗐다. 전화통화 내내 울었던 엄마는 아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아프리카 기사를 봤다고 했다. 그리고 “아들이 천국 평안을 느꼈듯, 단 한명의 아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우물을 기증했다.
가서도, 와서도 온통 우울한 그 땅에 어쩌자고 다시 가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 곳으로 떠난다. 이 글이 읽힐 때 즈음이면 이미 아프리카 현지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있을 때다.
이번 여정은 더 험난하다. 막막한 사막과 먹먹한 난민촌이 기다리고 있다. 보고 만진 아픔은 더 클 것이고, 가슴은 더 무거울 것이다.
가장 두려운 것은 헤어지면서 또 듣게될 같은 질문이다. ‘언제 또 오냐’ 묻던 하우아처럼 말이다. 어쩌면 그들이 내게서 원하는 것은 돈이나, 물이나, 약보다 희망의 확인일지 모른다. 기약없지만 또 다른 하우아와 손가락 걸고 약속하려 한다.
“아저씨 또 올게.”
정구현/ 논설위원
발행: 11/12/13 미주판 22면 기사입력: 11/11/13 15:34

![[스토리 IN] 다시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2013년 11월 11일 중앙일보](https://kr.somangsociety.org/wp-content/uploads/2012/02/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