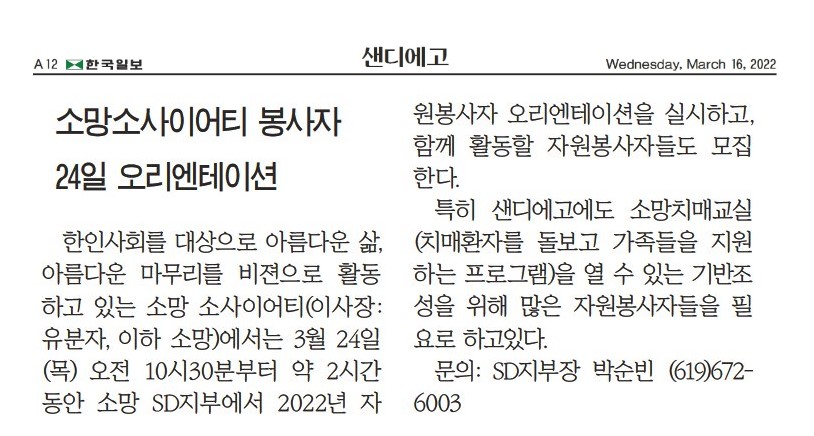이기춘 이사장
전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과 교수
한국 생명의 전화 이사장
국제 생명의 전화 한국대표
생명의 전화는 한 통화의 전화로 번민하는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24시간 상담 전화를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 1976년 생명의 전화가 개통된 이래 하루 150통~200통의 상담전화가 걸려온다. 간절한 사연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자살하려고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생명줄을 놓지 말기를 간곡히 권하는 전화 한 통화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생명존중실천의 앞자리에 이기춘 생명의 전화 이사장이 있다. 죽으려고 하는 에너지를 사랑으로 이해하며, 전화처럼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주어 소통하는 동반자가 되어 주고 있다.
-요즘처럼 자기 생명이나 남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의 원인이 무엇일 까요?
“문화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제일 크죠. 자본주의, 황금만능주의,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물질적인 풍요가 있어야 행복하다는 생각이 팽배해서 생명을 천시해요. 그러면서 나의 행복을 위해 남의 생명을 경시하고, 이용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관이 손상됐어요.”
_OECD 가입국가 중 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도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만의 자살이유를 본다면 청소년의 경우에는 정체성, 학업, 부모와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고, 청장년층은 실직등의 이유로, 노인들은 경제적인 이유가 많아요.
또 다른 OECD국가와 달리 자살에 대한 사회적인 연결망이 되어 있지 않아요. OECD국가에서는 자살하겠다는 전화가 오면 그 순간부터 전화로 위치 추적을 해서 집을 찾아 들어가서 병원으로 옮기는 게 ㅡ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통신비밀법에 의해서 전화위치추적을 할 수 없고,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건 가택침입죄, 병원에서는 누가 병원비를 댈 건지의 문제로 자살자를 구할 수가 없어요. ‘자살예방법’은 이런 세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서 자살을 예방하자는 건데 , 지난 번 최진실 사건이후 국회에서 이법이 통과되는 줄 알았는데 유야무야되서 안타까워요.”
죽음이 괴롭기는 해도 무섭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목회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1963년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첫 목회지가 강원도 광산촌의 화전민 교회였어요.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까만 동네였어요. 하루는 주일학교 여학생집을 심방갔는데 한 50대의 노인이 움막집에 누워 있었어요. 여학생의 아버지였는데. 간암에 걸려 피골이 상접하고 얼굴이 새까매서 지독한 냄새가 진동했어요. 병원에라도 가보지 너무 아파서 어떻게 참느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분이 조용히 대답하기를 ‘우리같은 화전민이 어떻게 병원에 갑니까? 그저 내 운명이거니 하고 참고 기다립니다.
죽음이 괴롭기는 해도 무섭지는 않습니다.’ 며칠 후 세상을 떠나서 들것에 싣고 가서 초라하게 장례식을 치뤘어요. 첫목회의 첫장례식이었어요. 그 노인의 끈질기게 살아갔던 삶은 그 당시 한국인의 줄기찬 삶의 이야기였어요. 역사를 지켜온 사람의 이야기 인거죠. 내 삶의 이야기에 그 분의 이야기를 큰 스승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내가 살려 줄 수는 없고 함께 울어줘야겠구나
-첫부임지에서 경험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돌봐주는 목회상담으로 관심분야가 바뀐 거군요.
“더 결정적 계기가 된 사연이 있어요. 1960년대 후반에 원주기독병원에서 임상목회를 하고 있을 때 40대 후반의 산모가 제왕절개수술하려고 응급입원을 했어요. 남편은 상투를 틀고,때묻은 솜바지저고리를 입은 화전민 할아버지였어요. 딸만 내리 여섯을 두어 아들 하나만 얻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진 끝에 아내가 48세에 임신을 했어요. 그러다 해산달이 되어 진통을 하는데 애가 나올 기미가 없이 산모가 탈진하자 달구지에 싣고 왔어요. 아내는 이미 초주검이 되어 있고, 아들은 사산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바닥을 치며 ‘내가 죽든, 마누라가 죽든 아들을 살렸어야 하는데 대가 끊겼으니 어찌 살까’ 넋두리를 하며 몸부림쳤어요. 이 두 죽음은 내게 위대한 스승이 되었어요. ‘내가 죽은 사람을 살려 줄 수는 없지만 함께 울어줘야겠구나’ 이야기꾼이 되기보다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평생 돌봄과 상담을 선택해서 살아오며, 낮고 그늘진 곳에 손길을 펴는 생명의전화와 한 몸처럼 지내왔군요. 그렇게 보낸 30년의 자화상이 어떤 건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버이처럼 살과 피의 공동체를 통해 지속시켜 나가는 지탱자(sustainer),
이야기를 들려주기보다는 듣기를 더 좋아하는 경청자(listerner),
먹고 마시는 밥상공동체를 활기있게 이끌어 주는 대화의 촉매자(catalyst) 쯤으로 그려보죠.”
인간이 유한하고 1회성이기 때문에 귀한 거죠.
-젊은 나이에 겪은 다른 사람의 죽음이 평생 큰 영향을 받는 게 분명하네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죽음이란 어떤 건가요?
“인간이 유한하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예요. 유한하고 1회성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귀한거죠. 영원히 산다면 불후의 소설이나 예술작품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최후의 성장단계라고 말할 수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삶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고, 신중하게 살아야 한다는 자각을 더하게 되죠. 결국 삶과 죽음이 분리할 수 없고 섞여있어요.”
-사람들이 삶과 달리 죽음을 무서워하고 절망하는 원인은 어디서 오나요?
“익숙한 이 세계와의 단절이 무서움의 가장 큰 원인이죠. 70년대 미국에서 죽음학을 공부할 때 임상에서 공동묘지체험이란 게 있었어요. 과제가 30분 동안 관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어떤 이들은 5분도 못 채우고 나와 버려요. 답답하고 세상관계로부터의 단절이 견디기 힘든 거죠. 나는 다행히 30분을 버텨냈는데 나의 죽음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나는 영원히 잊어지는 거다. 아무 것도 아닌 것, 비존재의 공포를 경험하는 시간이죠.”
-어떤 죽음을 좋은 죽음이라 할까요? 또 본받고, 닮아가고 싶은 죽음의 모습이 있으시죠?
“서양에는 임종방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족과 지내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와요. 편안하게 과오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요.. 당뇨 부작용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죽음이 임박하니까, 초코렛을 맛있게 먹고, 설탕 듬뿍 넣은 커피를 마시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쁘게 죽은 사례가 있어요. 이런 일이 호스피스가 생긴 이후 가능해졌어요. 누군가와 상처나 오해 없이 ‘용서해주세요’, ‘용서합니다’, ‘안녕’ 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값진 죽음을 맞는 사람이예요. 죽음에 끌려가는 죽음이 아니고, 죽음을 맞으면서 죽는 죽음이 좋은 죽음이죠. 죽음을 싫어하는 사람은 회상을 하지 않고 살아요. 전혀 죽음준비를 하지 않죠.”
‘자살’은 ‘살자’의 구조요청
-자신을 돌아보며 그때그때 삶을 점검하고 살고, 자기 죽음을 맞으면서 죽게 된다면, 목숨을 소중하게 여길 텐데요. 그런데 요즘의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자살신드롬에 대해 생명의 전화에서는 어떻게 상담하는가요?
“생명의전화는 100% 자원봉사자가 상담을 하고 있어요. 위기가 닥친 사람들에게 아마츄어가 상담하는지 의아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냥 들어주고, 붙들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비전문가 봉사자가 더 효과가 좋아요. 전문가들은 자꾸 분석하려고 해요. 세계적으로도 1차적 예방은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어요. 너무 심각한 상담은 전문가와 연결을 시켜주죠. 의외로 자살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정신과 의사는 소수예요. ‘자살’은 ‘살자’의 구조요청의 또 다른 신호예요. 이 첫 번째 구조신호에 생명의 전화는 귀를 모으죠.”
-걸려오는 상담전화를 기다리는 것 외에, 적극적으로 사회를 향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자는 생명존중운동도 하고 있죠?
“결국은 생명가치를 올리는 게 우선이더군요, 자살예방도 우리들의 가치관에 생명사랑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예요. 그래서 3년 전부터 ‘생명사랑밤길걷기’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청소년과 가족이 참여해, 해가 지면서부터 동이 틀 때까지 함께 걸으면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인생여정의 어둠을 헤치듯이 희망과 용기를 주고 받는 정신을 확산하자는 거예요. 자살을 모면한 사람의 간증도 듣고, 유가족을 돌보는 프로그램 속에서 내 생명 가꾸는 일에 관심을 두자는 게 취지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한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뿌리가 내릴 때까지 밤길을 함께 걸을 겁니다.
<삶과 사랑과 죽음> 2009년 3,4월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