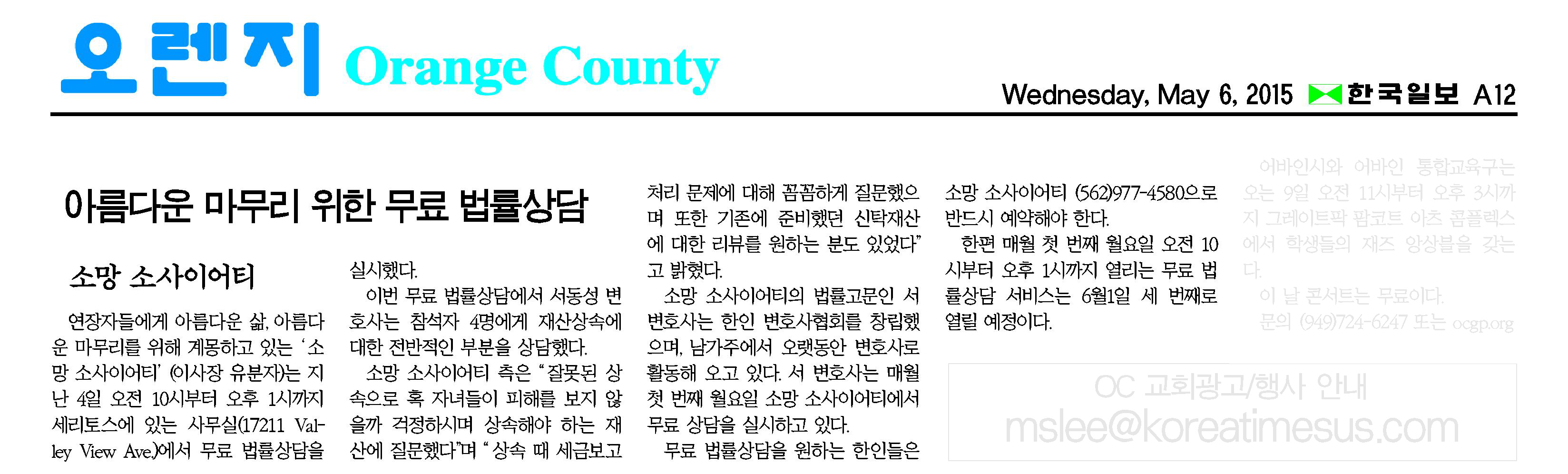“당나귀 탄 엄마는 노래했다. 품에 안은 아픈 아들을 달래기 위해서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멀었고 가다가 아들은 죽었다.”
통역으로 조각난 말이다. 한밤중 사하라 사막 마을에서 만난 스무 살 엄마 팔마타가 두살 난 아들을 잃은 사연은 짧았다.
아들이 아픈데 노래를 불렀다는 팔마타의 슬픔은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후에야 이해했다.
팔마타가 사는 마을에서 병원까지는 모래길 80km다. 나귀를 타도 8~9시간은 족히 걸린다. 110도가 넘는 불볕 아래 불덩어리같은 아들을 안고 그녀는 나귀를 몰았을 거다. 빨리 가지 않는 나귀와 빨리 가야하는 모정의 애타는 싸움은 그후 몇시간 동안이나 계속됐을 것이다.
더러운 물을 마셔 설사만 하다가 결국 숨을 놓아버린 아들을 안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약도 먹일 것도 깨끗한 물도 없었던 엄마가 부르던 노래는 노래라기 보다 울음이었을 터다.
3년 만에 찾아간 아프리카는 여전히 물 때문에 울고 있었다. 말로만 듣던 사막에서 생명은 모래처럼 가벼웠다.
2010년부터 극빈국 차드에 깨끗한 물을 주기 위한 소망우물 프로젝트에 한인들의 성금 열기는 뜨거웠다. 우물 200개가 놓였고 그 소식에 안도했다. 하지만 다시 가서 본 그땅의 ‘우물 지도’는 아직 충분치 못했다. 차드의 남쪽 절반만 채우고 있다(사진).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우물사업은 접근이 용이하고 우물 설치 후 지역개발 사업으로 전환하기 쉬운 지역을 우선 순위로 한다. 쉽게 말해 거리가 멀고 지역 개발을 하기 쉽지 않은 곳은 우물 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쪽 사막지역에 놓인 우물은 기자가 찾아간 ‘리와(Lioua)’가 유일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막 지역의 목마름은 남쪽보다 더 절실하다. 어렵게 찾아간 사막의 오아시스는 구정물이었다. 리와 마을이 있는 사하라 초입 사헬(Sahel) 벨트지역은 2010년부터 3년째 대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먹을 것도 물도 없다.
다녀와서 그 안타까운 사정을 전했더니 이내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몇몇 한인들의 후원금이 굿네이버스USA와 소망소사이어티에 전해져 사하라 사막 지역에 우물 4개를 더 놓기로 했단다.
그 넓은 사막에 우물 4개를 더 놓는다고 한들 달라질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지 모르겠다.
우물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 보다는 수단이다. 물이 있어야 사람은 살 수 있다.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된 곳이어야 병원도 학교도 세울 수 있다.
왜 아프리카를 도와야 하느냐고 아직도 묻는 사람들이 있다. 차라리 북한 아이들을 돕거나 이웃의 홈리스를 도우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굳이 지원 대상의 당위성을 설명하라고 한다면 북한의 아이들에게 내 지원금이 확실히 끊기지 않고 전달되는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다. 또 물이 없어 구정물을 마시는 이웃의 홈리스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
구정물 때문에 죽어가는 아들에게 해줄 것 없어 바라만 보는 사막의 모정은 당장 더 절박하게 보였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피부색이나 지역이나 이념을 떠나 손을 내미는 결심이 먼저다. 사실 돕는 대상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할 뿐’이다.
‘당나귀 탄 엄마’들은 노래밖에 못해서 오늘도 운다.
▶도움 주실 분: 소망소사이어티 (562)977-4580/굿네이버스 (877)499-9898
발행: 12/10/13 미주판 22면 기사입력: 12/09/13 22:27

![[스토리 IN] 당나귀 탄 엄마의 노래 2013년 12월 10일 중앙일보](https://kr.somangsociety.org/wp-content/uploads/2012/02/1-3.png)